|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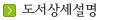 |
|
|
이 책은 <서편제> <소리의 빛> <선학동 나그네> <새와 나무> <다시 태어나는 말> <살아 있는 눈> <눈길> <해변 아리랑>의 모두 8편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과 소리 혹은 억압과 예술의 관계가 나타난 작품집이다.
<서편제>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소리꾼 남매의 가슴 아픈 한과 여기에서 피어나는 소리의 예술을 그린 작품이다.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이 하는 소리꾼과 그의 딸의 이야기에서 소리에만 미쳐 살아가는 소리꾼이 그 딸 또한 소리장이로 만들기 위해 딸이 잠자는 사이 두 눈에 청강수를 넣어 두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하면 눈으로 뻗칠 사람의 영기가 귀와 목청으로 옮겨가 소리가 비상해 진다는 것이다. 즉 좋은 소리를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보성읍 밖의 한적한 길목 주막이 '소릿재 주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곳에 소리꾼 여인과 북장단을 하는 사내가 나온다. 여자는 혼자 사는 그 집의 주인이고 사내는 하룻저녁 손님이다. 춘향가, 수궁가 등을 들으며 소리에 빠져 들어간 손님의 재촉에 의해 여인은 그녀에 앞서 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죽은 어느 소리꾼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그 소리꾼은 어린딸 하나와 떠돌며 소리를 하다가 죽어간다. 그가 죽고난 뒤 소리는 어린딸에게 이어졌는데 그 딸의 소리에서 사람들은 아비 소리꾼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한편 이야기의 진행은 애당초 소릿재 주막에 들른 손님이 원래 그 소리꾼의 의붓아들이었음을 그리고 그의 딸 역시 의붓동생이었음을 밝혀간다. 즉 소리꾼은 주막손님의 어머니가 관계했던 남자였고, 그 딸은 그 결과로 태어난 소생이였던 것이다.
<소리의 빛>은 <서편제>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서편제의 두 주인공, 즉 의붓남매가 역시 전라도 장흥땅 산골 주막집에서 우연히 상봉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주막집 주방에서 일하며 묻혀 살아가는 장님 여동생울 찾아 떠돌다 그곳에 나타난 오라비는 그녀에게 소리를 청한 다음 자신은 북장단을 듣고 빔새도록 소리판을 벌인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헤어진다. 소설 제목 그대로 만질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소리의 빛처럼 밤새 반짝이던 빛 마저도 오간데 없이 흘러가 버리고, 날아가버린 소리의 모습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선학동 나그네> <새와 나무> 역시 소리라고 표현되는 창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작품들은 각기 다른 내용을 그리고 있다.
현재, 서편제는 우리의 정서에 바탕을 둔 영화제작에 몰두해온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많은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엘리트2000 제공]
지은이 소개
이청준
이청준이 문학의 길로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열 살도 되기 전 어린 시절 수년간에 잇달아 겪었던 아버지와 맏형 아우의 죽음이었다. 특히 스물여섯에 요절한 시골 멋쟁이 맏형은 그가 읽은 책들의 행간에 적어놓은 단상이나 일기장,생전의 친지들과 주고 받은 편지들을 통해 이청준의 문학적 상상력에 근원적 영향을 미쳤다.
오지벽촌에서 난 `광주유학생`으로 마을의 자랑거리이던 이청준은 법학을 공부하여 출세하는 길 대신, 고등학교시절부터 빠져들었던 문학의 세계를 좇아 독문학과에 진학하였다. 재학 중 군대에 간 사이 함께 자취하던 이가 이청준의 일체의 책이며 이불이며 일기장이며 성적표며 하는 것들을 모조리 갖고 사라진 바람에 이청준은 졸지에 자신의 `과거`를 온통 잃어버리고 말았다.
제대 후 볼펜 한 자루와 노트 한 권 달랑 챙겨들고 친구들 자취방을 찾아 동가식서가숙하던 `부랑아` 시절에 그는 본격적으로 문학을 시작했다. `잃어버린` 자신을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이청준은 고도의 관념적인 주제들을 붙들고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넓혀가며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치열하게 굴착하는 한편, 지식인의 역할, 산업사회와 인간 소외 등 현대사회의 묵직한 주제들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하였다. 등단작인 『퇴원』부터 『조율사』 『병신과 머저리』 『당신들의 천국』 『소문의 벽』 등은 이러한 계열의 대표작들이다.
또한 1976년 이후에는 『서편제』를 필두로 한 남도사람 연작을 발표하며 토속적인 정한을 담은 문제작들을 연달아 생산해 내었다.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서편제』는 잊혀져 갔던 `우리 것`의 가치를 전 국민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96년에 다시 임 감독과 손잡고 영화제작과 동시에 그 밑그림으로 써낸 『축제』는 이청준 문학의 주요한 자양분이었던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식과정을 소설화해 낸 것으로 문학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등단 이후 120여편의 중단편과 11편 의 장편소설, 그리고 수편의 `판소리동화`에 이르기까지 이청준의 문학세계는 그 자체가 `서구 소설 장르의 한국적 갱신의 과정`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
|
|
 이 상품에 대한 총 0 개의 이용후기가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총 0 개의 이용후기가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