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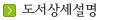 |
|
|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현대인들은 이 문제를 왕왕 간과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이다. 밀리언셀러 [바보의 벽]의 저자 요로 다케시는 그의 새 책 [죽음의 벽]에서 “근대에 들어와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죽음의 문제를 삶에서 배제하고 ‘나는 죽어도 내 의식은 영원불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삶은 죽음 때문에 의미 있는 것...삶의 최종 해답은 죽음이다
저자는 우리가 외면해온 죽음의 문제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특유의 통찰력과,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급스런 담론, 문명사회를 향해 던지는 폐부를 찌르는 비판을 통해 쉽고도 경쾌하게 담아낸다.
우리는 부모의 죽음과 맞닥뜨리며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절절히 깨닫기 시작한다. 저자는 “죽음이 있기에 인간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인생의 모든 행위는 돌이킬 수 없으며, 죽음만큼 그런 인생의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악惡이 있기에 선善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삶은 죽음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가, 그는 말한다. “인생의 최종 해답은 죽음이다.”
‘나의 죽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시신에도 1, 2, 3인칭이 있다고 말한다. ‘1인칭 시신’은 관찰하는 주체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인칭 시신, 즉 ‘내 시신’은 없는 셈이다. ‘2인칭 시신’은 가족·친구 등의 시신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죽음의 슬픔’이란 감정을 동반하는 시신이다. ‘3인칭 시신’은 경찰서 게시판에 게시된 ‘어제의 교통사고 사망자00명’과 같이 나와는 무관한 시신이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1인칭의 시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 1인칭의 시신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의 죽음’이나 ‘그들의 죽음’은 존재해도, ‘나의 죽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을 실제 이상으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쿄대학 의대 해부학 교수 출신의 저자는 우리가 시신을 두려워하고 불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연상하는 시신이란 영화나 소설에서 관객이나 독자에게 공포를 심어줄 목적으로 변형시킨 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죽음을 삶과 자연에서 격리시킨 도시문명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섭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인데, 도시는 그런 자연을 거부하고 배제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근대화의 산물인 도시는 인간의 뇌가 생각한 것이 형태를 이루어 현실화한 곳이며, 따라서 ‘몸’이나 ‘자연’과는 동떨어진 ‘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
지금은 시신을 멀리하고 터부시하지만 중세까지는 죽음과 시신을 친근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시신을 보다 빨리, 죽음을 보다 멀리 밀어냈다는 것이다.
시골 사람 역시 시신을 경원할 테지만 그 정도와 질은 많이 다르다. 과거 우리 농촌에서는 조상들의 묘를 집 앞 논이나 야산에 모시고,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삶과 죽음이 스스럼없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인도에서는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옆으로 시신이 둥둥 떠내려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하는 정도의 반응뿐이다. 그만큼 그들이 죽음을 가깝게 여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죽음을 멀리하는 태도와 화장실 문화에 유사성이 있다는 재미있는 지적을 한다. 수세식 변기는 인간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내보낸 것을 가능한 보이지 않게, 느낄 수 없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변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가능한 시야에서 멀리로 밀어낸 것이다.
그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법이다”(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말을 인용하며, 죽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 말은 장례식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혼식이란 어디를 가나 큰 차이가 없지만, 장례식은 고인과 가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은 고인의 집대성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대인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죽음을 멀리하는데 이는 신체를 멀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 의식意識에만 치중하다 보니 신체가 잊힌 것이고, 덩달아 자연의 일부인 죽음도 현실성을 잃고 만 것이다.
|
|
|
 이 상품에 대한 총 0 개의 이용후기가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총 0 개의 이용후기가 있습니다. |
|
|
|